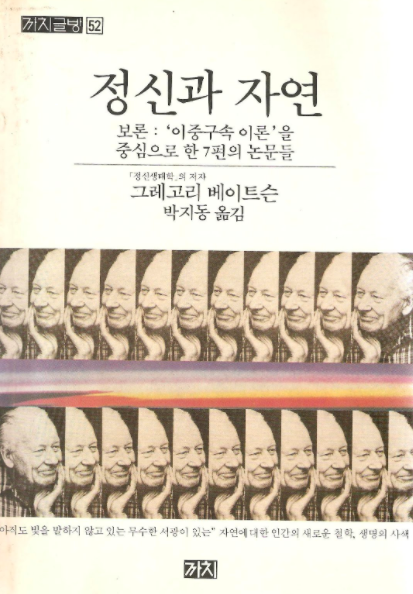
자기 인식. 메타 성찰.사이버네틱스.
1) 인간의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하게 대비되는 추상의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항상 기능한다. 추상적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또는 집합에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 실린 현재적, 잠재적 메시지가 포함된다. 이것을 메타 언어라고 칭할 수 있다. 추상의 또 다른 수준의 집합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1). 이 경우 대화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2)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에 대해 고찰해보면 진화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란 생명체가 다른 생물체의 분위기 기호(mood-sign)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점차 중단하고 그 기호를 신호(signal)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이다. 신호라는 자극은 자신과 똑같이 복잡한 동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 구상되고 전달된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서 생긴 사건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반응한다.
인간이라는 생물체는 자신들이 '신호는 신호이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진화하기 시작했다. 인간 특유의 언어발명이 그 발견에 뒤따를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감정이입, 동일시, 투사 등의 복잡한 요소들이 뒤따를 수 있었다.
3) 동물이 '놀이하는 것'.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동작과 신호는 싸움할 때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연쇄적인 상호 행동을 을 하면서 놀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현상, 즉 놀이는 상호 행동하는 생물체가 어느 정도의 메타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이것은 놀이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4) 다음 단계는 이 메시지에 에피메니데스 식의 역설이 필수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이런 행동이 표시하는 행동들에 의해 표시되는 어떤 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 "장난스럽게 무는 행동은 물어뜯는 행위를 표상하지만 물어뜯는 행동에 의해 전달하는 어떤 기호는 표시하지 않는다." 논리계형 이론(Theory of Logical Types)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5) 인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표시(표상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어와 문장이 어떻게 사물과 사건에 관계되어야 하는가를 조정하는 메타 언어적 법칙의 복잡한 체계가 진화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사건을 의미하는 신호(두 가지 층위의 추상과 메타 언어)의 예를 놀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6) 행동이 다른 행동을 암시하면서도 그러한 다른 행동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협' 또한 놀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위협하기 위해 꽉 움켜진 주먹은 펀치와는 다르지만, 그것은 미래에 가능한/잠재적인 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개체와 암묵적으로 공유되며 일반화된 인식으로 작용한다.
7) 연극적인 행동과 사기는 언어-실제 구별이 일차적으로 드러난 또다른 예이다. 극화가 새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다. 길가마귀는 자신의 분위기-기호를 모방하기도 하고, 짖는 원숭이들 속에서 속이는 행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8) 놀이, 위협, 연극은 포유동물의 진화에 공헌했던 세 가지 행동은 총체적 복합 현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놀이( 도박, 성인 놀이)는 위협과 놀이의 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극과 구경이라는 행동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연민 역시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9)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의식'도 포함. 화해 의식에 대한 인류학자의 연구..앤더맨 섬에서의 화해 의식에서는 서로에게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자유를 먼저 주는 과정이 동반된다. 이러한 실제 행동의 표시와 추상적 표시의 구별에 균열이 생기게 될 경우, 화해의 의례에서 이루어지는 구타가 싸움할 때의 진짜 구타로 오판되기 쉽다. 이럴 때 화해의식은 도리어 전쟁이 된다.
10) 이것은 더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앞선 사례의 '놀이'는 "이것은 놀이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이것은 놀이일까?"하는 질문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1) 놀이, 위협, 연극 등의 현상 속에서 교환되고 있는 신호들 가운데에는 이중적인 역설이 존재한다. 장난스럽게 무는 행동은 그것이 의미하는 물어뜯는 행동에 의해 무언가를 표시하기보다는 어떤 허구를 담는다. 놀이하고 있는 동물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동시에 실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인간 차원에서는 놀이, 공상, 예술이라는 각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복합성과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감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경우. 포커 게임을 하는 자들은 돈과 칩을 동일시함으로써 기묘한 중독성의 '리얼리즘'을 얻기도 하며, 동시에 패자는 자신의 손실을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술, 마술, 종교가 만나고 겹치는 영역에서 인간은 목숨을 기꺼이 바치게 되는 어떤 은유(의미 있는 은유), 이를테면 성찬식에서의 성사, 깃발, 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와 영토의 차이를 부정하고, 순수한 분위기-기호라는 수단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절대적 순진함으로 돌아가려 하는 시도를 알 수 있다. '분위기 기호'라는 수단에 의해 '은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2)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놀이의 두가지 특성을 마주하게 된다. 첫째, 놀이에서 교환되는 신호 혹은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 아니며 명확하게 의미하는 바도 없다. 둘째, 이런 신호에 의해 표시/표상된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 특성이 결합하면 기묘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무언가가 실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실재했을 때의 충격/공포/희열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어떤 환상에서의 유사행위에는 실제 행위에서 기인하는 어떤 특정한 태도를 표현하고 의미한다. 어떤 해석/허구도 그것이 '실제처럼 체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특정한 목록의 진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제시된 해석의 구조적 틀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13) The discussion of frames and contexts. A paradoxical frame (ex. I love you, I hate you)
14)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주어진 전제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부당한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이나 '일차적 과정'의 사고는 '일부'와 '모두, '그리고 '모두 아닌'과 '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5) 그러나 역으로 "모두"와 "아무것도" 사이에서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기 위한 설명 근거로 일차 과정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곧 놀이가 단순한 일차 과정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꿈과 현실 간의 구별처럼 "놀이"와 "비놀이"의 구별도 이차 과정 또는 "자아"의 작용일 것이다. 꿈을 꿀 때 꿈꾸는 자는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지 못한다면, "놀이"를 할 때 "이것은 놀이이다"라는 사실은 자주 상기되어야 한다. But, conversely, while it is necessary to invoke the primary process as an explanatory principle in order to delet the notion of "some" from between "all" and "none", this does not mean that play is simply a primary process phenomenon. The discrimination between "play" and "nonplay", like the discrimination between fantasy and nonfantasy, is certainly a function of secondary process, or "ego". Within the dream the dreamer is usually unaware that he is dreaming, and within "play" he must often be reminded that "This is play". 일차 과정에서 표상-실재는 동일시되지만, 이차 과정에서 그 둘은 구별될 수 있다. 놀이에서 그 둘은 동일시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한다.
16) 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논리적 변칙을 언급해야만 한다. "전제"라는 단어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술된 두가지 명제 사이의 관계는 (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비추이적intransitive이다. 심리적인 틀을 규정하는 첫 단계는 그것이 메시지들(또는 의미 있는 행동들)의 클래스나 집합이라고(또는 클래스나 집합을 경계짓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틀은 가상의 선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수학적 츄추는 붕괴된다. 분석가는 설명의 원리로 무의식적 틀을 사용하면 자신의 사고가 간단해지는 것을 발견한다.
17) 그러나 여전히 틀이 의미하는 것과 맥락의 개념과 관계가 된 것은 분명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심리적인 "틀"을 규정하는 작업의 첫 단계는 그것이 복수의 메시지(또는 의미있는 행동)의 집합 즉 class라고 말하는 것이다. 심리적인 틀은 위상기하학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의식적인 틀"의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심리적인 틀의 방식은 단순화된다.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외부의 이미지로서 표상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18) 이제 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심리적 틀의 일반적인 기능과 효용을 열거하고자 한다. (a) 심리적 틀은 배타적이다. 틀 속의 어떤 메시지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배제한다. (b) 심리적 틀은 내포적이다. 어떤 메시지는 배제시킴으로써 다른 것이 내포된다. 둘은 확실히 별개의 과정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는 "외부에 있는 것을 주시하지 말고 내부에 있는 것을 주시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c) 심리적 틀은 일종의 "전제"를 제공한다. 즉,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볼 지를 이 틀이 결정하게 되면, 배제되는 메시지와 내포되는 메시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d) 잠재적으로 또는 현재적으로 틀을 규정하는 어떤 메시지는 그 틀 내에 포함된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도에 실제로 도움을 주거나 또는 지시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e) 메타커뮤니케이션 메시지나 메타 언어적 메시지는 자신이 소통하고 있는 메시지의 집합을 명시적 또는 함축적으로 정의한다. 즉 모든 메타커뮤니케이션하는 메시지는 심리적 틀을 규정하거나 그 틀이 된다. (f) 심리적 틀과 지각적 게슈탈트의 관계는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림이 있기 위해서는 액자가 있어야 하듯이, 바탕을 경계짓는 외곽의 액자가 필요하다. 바탕에 대한 이런 바깥쪽 경계선의 필요성은 추상의 역설을 피하기 위핸 선택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역설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틀이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그림 액자는 어떤 논리 형태의 항목들을 다른 논리형태의 항목들과 나누는 선이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러셀의 법칙은 그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는 기술될 수 없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9) 동물 행동을 통한 예증 (a) messages of the sort which we here call mood-signs분위기 기호의 메시지, (b) messages which simulate mood signs (in play, threat, histrionics, etc) (놀이, 위협, 연극 등에서) 분위기 기호를 모방하는 메시지 (c) 분위기 기호와 그것과 유사한 기호를 수신자가 구별하게 해주는 메시지 "이것은 놀이이가"라는 메시지는 세번째 종류의 메시지에 속한다.
20) 놀이와 심리적 틀에 대한 위의 검토는 메시지 사이에 세 개의 배열 형태(triadic constellation)를 만든다.
21) 결론적으로 위의 이론적 접근을 정신요법의 특별한 현상에 적용하는 일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답함으로써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떤 종류의 정신 기능 장애는 틀과 역설을 조작하는 환자의 비정상적인 증세에 의해 특별하게 특징지을 수 있는 지시를 보여주는가? 둘째, 정신요법의 기술은 반드시 틀과 역설의 조작에 의존한다는 지시가 있는가? 셋째, 환자가 틀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틀을 조작하는 상호행동에 의해서 일정한 정신요법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가능한가?
22) 첫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신분열증의 몽유병적 증상이 환자가 자신이 가진 환상의 은유적 성질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다고 대답될 수 있다. 즉, '마치...처럼'과 같은 구저링 생략됨으로써 실재-허구의 경계가 물러진다는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메타커뮤니케이션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다 단순하고 원초적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능력도 상실된다.
23) 치료는 환자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적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틀의 조작에 대한 정신요법의 의존이 있게 된다. 치료 전에 환자는 메시지를 해독하고 만들기 위해 일련의 어떤 규칙에 따라 생각하고 활동한다. 치료가 성공한 후에는 일련의 다른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 규칙의 변화change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음에 틀림없다.
놀이의 역설이 진화의 단계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비슷한 역설이 정신요법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주장하겠다.
사실 놀이 현상과 치료 과정의 유사함은 뿌리 깊은 것이다. 양자는 모두 경계지어진 심리적 틀 내부에서 발생하며 상호적인 메시지의 집합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정된 틀 내부에서 발생한다. 놀이와 치료에서 '메시지'는 보다 구체적이며 기본적인 현실와 독특한 관계를 맺는다. 심리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신호의 조작에 의해 "전이"가 발생한다.
치료 과정의 형태적 특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한 모델을 만들게 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일련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는 두 선수를 생각해보자. 갑자기 놀이하는 것을 중단하고 규칙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을 때, 개정된 규칙으로 다시 놀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실험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제안될 수 있고, 엄밀히 말해 정신요법에서 이러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알다시피 정신 요법의 과정은 두 사람 간의 틀 지어진 상호작용이며, 거기서 규칙은 잠재되어 있지만 변화의 대상이다. 사실상 진화하는 상호작용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규칙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기 쉽다. 이 규칙을 변화시키려면 실험적인 행동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음. 실험적인 행동을 통해서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게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24) 환자가 틀을 다루는 방식과 치료사가 틀을 조작하는 방식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현재는 언급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치료의 심리적 틀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달성할 수 없는 '틀을 설정하는 메시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치료의 심리적 틀 내에서 '말 비빔'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병이 아니다. 사실, 신경증 환자는 오히려 바로 그렇게 하도록, 자신의 꿈과 자유 연상을 말하도록 장려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신경증 환자는 자신이 이전에 반대했거나 억압했던 일차적 과정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에 '마치...처럼'이라는 구절을 삽입하도록 강요받는다. 환상이 진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그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다르다. 환자의 오류는, 일차적 과정의 은유를 문자 그대로 완벽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들 은유가 의미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그것들이 단지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한다.
25) 하지만 연구 계획의 관점에서 정신 요법은 우리가 연구하려는 많은 분야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핵심 주제는 추상의 역설의 필요성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추상의 역설을 분위기-기호의 역설보다 더 복잡한 외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런 역설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는 종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은, 양식화된 메시지의 끝없는 상호 교환, 변화나 유며로 바뀌지 않는 엄격한 규칙을 가진 게임이 될 것이다.
(1) 예를 들면 '고양이'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은 고양이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른바 우정 같은 것이다."
'01 tex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본>에 대한 노트_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알렉산더 클루게_김수환 유운성 역_문학과지성사 (0) | 2020.04.15 |
|---|---|
| 퍼포먼스, 윤리적 정치성_김홍석_현실문화_2011 (0) | 2020.04.15 |
| 자아 연출의 사회학_어빙 고프먼_진수미 역_현암사_2016 (0) | 2020.04.03 |
| Embodiment as a Paradigm for Anthropology_Csordas_1988 (0) | 2020.03.28 |
| 몸의 기술_마르셀 모스_1973 (0) | 2020.03.27 |



